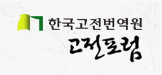Hind's Feet on High Places
우물 속의 달(山夕詠井中月) 본문
 | - 마흔 두 번째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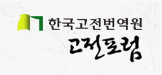 |
| 우물 속의 달 | 산사의 스님이 달빛을 탐하여
물동이 속에 달도 함께 길었네
절에 가면 응당 알게 되리라
물동이 기울이면 달까지 사라짐을 | | 山僧貪月色
幷汲一甁中
到寺方應覺
甁傾月亦空 |
|
|
- 이규보 (李奎報 1168 ~1241)
〈산 중의 저녁에 우물 속의 달을 읊다 [山夕詠井中月]〉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후집 권1 |
|
 |
고려의 대문호 이규보의 시이다. 이 시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色卽是空)을 아이디어의 골격으로 삼고 있다. 작시 의도도 철학적인 세계를 진지하게 보여 주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산승(山僧)과 저녁, 우물에 비친 달빛이 빚어내는 탈속적이고 고고한 분위기의 창출이랄까, 재기 발랄한 발상이 가져다주는 신선함과 정신적 충격 같은 걸 노린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시 비평에 안목이 높았던 남용익(南龍翼 : 1628~1692)은 이 시를 고려조의 5언 절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7언 절구에는 정지상(鄭知常)의 <송인(送人)>, 5언 율시에는 이색(李穡)의 <부벽루(浮碧樓)>, 7언 율시에는 진화(陳澕)의 <경도(京都)>를 꼽고 있어 작가적 안배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그런대로 수긍이 간다. 진화의 <경도>는 비교적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대우나 평측 등, 한시의 형식미가 현대인에게는 크게 감응력이 없기 때문에 글 쓰는 이들이 소개하기를 꺼린 탓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문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고 한시를 생활 속에서 짓는 것이 아니다 보니 애호가나 연구자들 모두 감식안이 전통 시대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의 문리가 좋은 분들에게 묻고 서로 토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인의 비평과 엄선한 안목에 다소간 의지할 필요가 있다. 대신 현대인들은 서구의 분석적 학습에 능하고 감성과 언어가 세밀하게 발달해 있는 데다 DB의 검색이나 공구서 등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앞의 단점을 잘 보완한다면 지레 겁을 먹을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
이 시에 대해서 역시 문필로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간이(簡易) 최립(崔岦)이 어린 시절에 쓴 시가 있다.
스님이 가서 우물물을 길어 僧去汲井水
동이 속에 달빛과 함께 담았네 和月滿盂中
절간에 돌아오니 달빛이 보이지 않아 入寺無所見
비로소 색즉시공을 깨달았네 方知色是空
《간이집(簡易集)》 권6
기본적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 왔다. 다만 물동이에 담아온 달이 절간 실내에서는 안 보인다는 언급을 통해 색즉시공의 깨달음을 앞 시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이수광(李睟光)은 앞의 시와 비교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혹평했는데, 아마도 색즉시공이 문면에 노출되어 은근한 맛이 사라진데다 이규보의 시처럼 입에 착 감기는 운율감이나 시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풍격이 다소 떨어져 밋밋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이 시의 차운(次韻)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권상하의 문인인 채지홍(蔡之洪 : 1683~1741)은 앞의 두 편의 시가 모두 공허함에 가까워 천리(天理)의 무궁한 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같은 운자를 밟아 한 편의 시를 지었다.
산사의 스님이 밤에 물을 길으며 山僧夜汲水
달빛을 물동이 속에 옮겨 담는다 移月積盆中
오래 길으면 그 달은 다하겠지만 汲久明應盡
맑은 달빛 도리어 허공에 가득한 것을 淸光却滿空
《봉암집(鳳巖集)》 권2
앞의 두 편의 시는 아이디어의 신선함은 있지만 다소 공상적인 면이 있다. 그에 비해 이 시는 이규보의 시처럼 참신한 맛은 부족하지만 성리학자의 진지한 맛이 풍기는 듯도 하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천리의 이법을 가감할 수 없다는 은유로 읽힌다. 그러나 시의 맛은 역시 이규보의 작품이 훨씬 나은 듯하다. 시라는 것이 꼭 내용상의 무게나 깊이를 더한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고려조의 5언 절구 중에 압권의 작품을 보았는데 조선 시대는 어떨까? 김만중(金萬重)은《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당시까지 나온 작품 중에 손곡(蓀谷) 이달(李達)의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이예장과 이별하며[江陵別李禮長之京]>라는 작품을 꼽았다.
오동 꽃에 밤안개는 내리고 桐花夜煙落
바닷가 나무에는 봄 구름 흩어졌네 海樹春雲空
풀밭에 앉아 한잔 술로 이별하니 芳草一盃別
서울에 가서 다시 만나세나 相逢京洛中
《국조시산(國朝詩刪)》 권1
손곡에게 시를 배운 허균은 앞 2구 뒤에 ‘고독한 정서가 매우 잘 드러났다.[孤情絶照]’는 평을 달아 놓았다. 첫 두 구는 얼핏 보면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두보의 시 <봄날 이백을 그리워하며[春日憶李白]>에 나오는 “위수의 북쪽에는 봄날의 나무요, 강 동쪽에는 해 저물녘의 구름.[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이라는 구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수 북쪽은 당시의 수도 장안(長安)으로, 바로 두보 자신이 있는 곳이고 강동은 이백이 귀양을 간 야랑(夜郞)을 가리킨다. 이백이 그리워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봄날 그리움에 젖어 있는 듯한 나무에 비유하고, 강동으로 귀양 간 이백을 떠도는 저물녘의 구름에 비기고 있는 것이다. 멀리 떨어진 벗을 그리워한다는 운수(雲樹)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하였다.
이달은 당시(唐詩)를 깊이 체득하여 앞 두 구에 그러한 의경을 환골탈태시켜 놓고 있다. 밤안개 부슬거리는 가운데 피어 있는 연보라 빛 오동 꽃은 우수를 자아내고, 쉽게 흩어지는 봄날 구름과 바닷가의 썰렁한 나무는 외로움을 환기한다. 친구가 서울로 떠나가는 아쉬움과 공허감을 자연 경물의 미감에 융합해 놓고 있는 것이다.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송별주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잠시 봄날 풀밭에 앉아 한 잔 술로 아쉬움을 달래며 서울서 재회할 것을 기약한다. 우정의 회포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시적 여운으로 길게 남는다.
|
|
 | 글쓴이 : 김종태(金鍾泰) / hanaboneyo@hanmail.net- 한국고전번역원 문집번역실 선임연구원
- 주요 약력
- 고종ㆍ인조ㆍ영조 시대 승정원일기의 번역, 교열, 평가, 자문 등 - 역서
- 《승정원일기》고종대, 인조대 다수
- 《청성잡기(공저)》,《허백당집(근간)》등 - 현 국민일보 <고전의 샘> 연재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