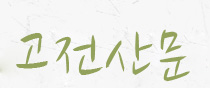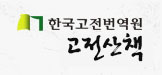간송미술관의 ‘매, 란, 국, 죽-선비의 향기’ 개막전이 열리던 지난 6월 3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를 찾았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간송문화전’ 시리즈의 4번째 전시였다. 늦은 오후, 특별한 의식 없이 개막한 전시장에는 일찍부터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간송미술관의 터줏대감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소장은 언제나 그렇듯이 한복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개막날이어서인지 문화예술계 명사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물론 전시장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그림들이었다. 한음 이덕형의 ‘묵죽’, 조속의 매화 그림 ‘묵매’, 유덕장의 눈 맞은 대나무 그림 ‘설죽’, 심사정의 매화, 최북의 국화, 김홍도의 매화, 김정희의 난초 등은 모두 교과서나 화첩에서나 볼 수 있는 명품들이었다. S라인을 따라 이어진 전시장을 따라가며 옛 그림을 보는 감동과 흥취는 간송의 미술품이 아니면 느끼기 어렵다.
그런데 뭇 명품들 속에서도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이 있었다. 탄은(灘隱) 이정(李霆)의 <삼청첩(三淸帖)>이었다. <삼청첩>은 세 가지의 깨끗한 물건, 즉 대나무와 매화, 난을 그리고 자작시를 함께 엮은 시화첩이다. 이번 전시에는 <삼청첩>에 포함되어 있는 대나무 그림 12폭, 매화 그림 4폭, 난 그림 3폭, 난과 대나무가 어우러진 난죽도 1폭 등 20폭 모두가 나왔다. 먹물을 들인 비단 바탕에 금니(金泥)로 그린 작품들은 최근 보존처리를 한 덕분인지 마치 방금 그린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졌다. 진열된 작품 가운데 ‘순죽(筍竹)’은 막 죽순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듯 보였고, 난과 대나무를 한 폭에 그린 ‘난죽(蘭竹)’은 두 군자가 고고한 기상을 뽐내듯 하였다.
나는 작품들을 다 감상한 뒤 전시장 첫머리에 있는 <삼청첩> 앞으로 돌아왔다. 다시 한번 꼼꼼히 작품을 보고 싶었다. 그제서야 나는 이 그림첩이 예사롭지 않은 사연을 담고 있음을 알았다. 위의 「삼청첩서」는 바로 곡절 많은 <삼청첩> 제작 경위를 기록한 글이다.
왕실의 후손으로 태어나 시문으로 풍류를 즐기던 탄은은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칼을 맞아 팔이 끊어질 뻔한 부상을 당한다. 붓을 잡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간신히 팔을 잇게 된 탄은은 예전보다 더 그림 공부에 몰두한다. 그리고 2년 뒤인 1594년 12월, 부상을 딛고 완성한 그림이 바로 <삼청첩>이다. 작품을 본 탄은의 친구 간이(簡易) 최립은 <삼청첩>을 앞에 두고 눈을 비비며 감탄했다. “이는 세상에서 기예로 이름을 얻었다는 사람이라도 다가갈 수 없는 경지이다.” 최립은 친구 이정의 예술혼과 불굴의 의지를 칭송하며 그를 위해 그림첩의 서문을 헌정한다. 그것도 모자라 최립은 또다시 「석양정이 보여 주고 놓고 간 삼청첩에 제하여 돌려주다[題石陽正見留三淸帖以還]」라는 시 한 수를 써 건넨다.
병란 후 삼 년 만에 이렇게 만나니
옥 같은 그림 한 권 남겨 두셨구려
팔뚝 거의 부러질 지경에 조물주 그대 보호하여
그대의 여생, 나로 하여금 눈 멀지 않게 하였네
맑은 향기 어찌 종이의 그림 속에서만 취했겠는가
굳센 절조 어여쁘니 눈과 더불어 논할 만하네
혼을 불어넣는 그림 솜씨야 예전부터 아오마는
시와 글씨 또한 풍류가 넘쳐 흐르네 | | 三年此會干戈後
一卷仍將琬琰留
造物全君幾折臂
餘生及我未昏眸
淸香豈取供花事
苦節應憐與雪謀
久識傳神推妙絶
詩篇字法又風流
|
이정은 자신의 그림과 자작시를 묶은 두루마리 앞에 최립의 서문을 붙여 <삼청첩>이라 이름 붙인다. 그리고 표지의 제호를 당대 최고의 서예가 석봉 한호에게 부탁한다. 이처럼 <삼청첩>은 ‘해동삼절’로 불리는 이정의 그림, 최립의 글, 한호의 글씨가 한데 어우러진 보물이다. 불행히 병자호란을 겪으며 화재로 최립의 서문 일부와 한석봉의 표제 글씨가 불에 탔다. <삼청첩>의 표제는 뒤에 동춘당 송준길이 다시 쓴 것으로 알려졌다.
* ‘매, 란, 국, 죽-선비의 향기’전은 8월30일까지 계속된다. |